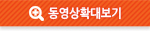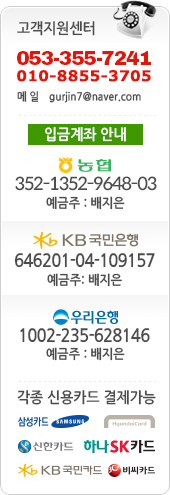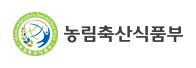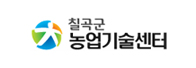골절에 대해
칠곡토종홍화농장은 농림부 선정 신지식농업인장1호가 운영하는 농장입니다.

골절의 정의는 뼈의 연속성이 완전 혹은 불완전하게 소실된 상태를 말한다. 외력의 작용이 강하여 뼈가 부분적 또는 완전히 이단된 상태로 쉽게 말해,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지는 것을 말한다. 부서진 뼈에 의해 신경이나 혈관 등이 손상 받을 수 있으며, 더욱 위급한 상황을 일으킬 수도 있다.
주원인은 외부로부터 물리적인 충격이 가해지는 직·간접적인 타격, 아동학대, 구타, 운동으로 인한 부상, 비틀림, 추락, 교통사고 등에 기인한다. 골절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골절로 인한 이차적인 손상, 즉 합병증이 문제가 된다. 그외에도 전기감전으로 인하여 근육이 강직(뒤틀림)되어 골절이 발생할 수도 있다.
고령자와 어린이는 그저 넘어진 정도의, 그다지 크지 않은 힘이 가해지기만 해도 골절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골다공증이라든가 뼈와 관련된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쉽게 발생한다. 골다공증, 골암, 대사이상증의 질병이 원인이 된다.
골절이나 전위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물리적 충격이 가해져야 한다. 이러한 물리적 충격은 사지에 다양한 양상으로 가해질 수 있으며, 직접 혹은 간접적인 충격이나 염전력 또는 고에너지 등으로 심각한 근골격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직접적인 물리적 충격은 골절의 흔한 원인이며, 직접적인 충격에 의하여 유발된 골절은 충격이 가해진 부위에 발생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사고의 경우 운전석 전면에 무릎을 부딪힌 경우는 무릎골 골절이 빈번히 발생한다. 간접적인 물리적 충격으로도 골절이나 탈구를 유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충격은 사지의 한쪽에 가해지지만, 손상부위는 충격이 가해진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부위에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사지의 근위부에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면, 손을 뻗힌 자세로 추락 한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광범위한 골절(손목뼈, 팔뼈 혹은 쇄골 등의 골절)이다.
염전력(뒤틀림)은 정강이뼈 골절 혹은 무릎관절과 발관절 인대손상의 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는 지면에 족부가 고정된 상태에서 염전력이 추가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스키 손상은 스키가 물체에 걸려서 넘어질 때 다리에 염전력이 작용하여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고에너지 손상은 교통사고나 추락사고, 총상 등과 같은 막대한 충격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상으로 골격이나 주위의 연부조직, 혹은 내부장기에 심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 부위의 골격계에 골절이나 탈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신체의 여러 장기에 다발성 외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모든 골절이 반드시 심한 물리적 충격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은 아니다. 골종양과 같은 국소적인 골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골조직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적은 충격으로도 쉽게 골절이 일어날 수 있다. 폐경기 여성에서 흔히 발병하는 골다공증과 같은 전신적인 골병변에서도 적은 충격에 의하여 골절이 쉽게 발생한다. 이러한 환자에서는 가벼운 낙상이나 단순한 뒤틀림, 심지어 근육수축에 의해서도 골절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노령자나 골질환자의 경우에는 가벼운 외상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골절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골절은 전락, 충돌, 사고 등에 의해 뼈에 큰 외력이 가해졌을 때 생기지만, 고령자와 어린이는그저 넘어진 정도의, 그다지 크지 않은 힘이 가해지기만 해도 골절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위의 내용은 대한적십자사 응급처치강사에서 참조하였습니다.

골절이란 뼈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부러진 것을 말합니다. 골절은 대개 심한 타박상이나 뒤틀림 등에 의해 발생하나 어린이들의 뼈는 약해 가벼운 힘(넘어짐 등)에도 골절상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골절상은 골절주위에 근육, 인대 및 피부의 상처를 동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특히, 뼈 주위에 있는 혈관과 신경이 상처 받기 쉽기 때문에 모든 골절상은 매우 주의해서 다루어야 합니다. 구부러진 뼈가 혈관을 상하게 하여 내출혈을 일으키거나, 주위 조직도 상해서 몹시 붓게 됩니다.큰 골절은 출혈량이 많기 때문에 안색이 나빠지고, 출혈성 쇼크를 일으켜서 생명이 위험해지는 수도 있습니다. 또 내장에 손상을 입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골절은 대개 그 통증의 정도와 상처부위의 모양으로 쉽게 알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외상을 입었을 때 팔, 다리를 약간 움직여서는 아프지 않지만 좌우상하로 심하게 움직이면 일정한 부위에 통증이 심해진다든가, 단순히 타박상이나 염좌상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통증과 붓기가 쉽게 가시지 않을 때에는 골절을 의심해야 합니다.
일반인은 골절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골절은 무엇으로 진단될 수 있나요? 골절상은 병원에서 방사선 검사를 통해 쉽게 진단될 수 있으나, 초기에는 안 나타나고 2-3주후에 재촬영을 할 때가 되어서야 나타나는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골절한 부위의 부종, 심한 동통, 부자연스러운 모양이 되는 변형 되에 환부의 뼈와 관절이 이상하게 움직입니다. 동통이 심하며,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도 몹시 아픕니다.

다친 직후여서 몹시 붓고, 부러진 뼈가 크게 어긋나 있는 등의 경우에는 이원하여 견인요법을 시행합니다. 이것은 잡아당김으로써 뼈를 바른 위치에 되돌리는 치료 요법인데, 대퇴골골절, 하퇴골골절, 어린이의 상완골과 상골절 등에 흔히 시행됩니다. 부러진 뼈의 위치가 적게 어긋나서 그대로의 상태로 뼈를 유합시켜도 좋은 경우에는 깁스를 대고 고정합니다. 고정 시에는골절한 부위의 아래위에 있는 관절을 포함하여 합니다.
고정해 두는 기간은 정기적으로 의사가 깁스를 떼고 X선 촬영을 하거나, 붓는 등의 증세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면서 결정합니다. 깁스로 고정하고 있는 중에 손가락 끝이나 발끝이 창백해지거나 감각이 무디어진 경우에는 손가락 끝이나 발끝의 혈관에 혈행 장애가 일어나 있는 증거이므로, 즉시 깁스를 떼고 치료해야 하는 수가 있으므로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깁스를 뗀 후에는 근력의 증강 운동과 관절을 움직이는 운동을 합니다.
골절 시 일반적 치료의 주의점은 고정된 골절부가 잘 유지되어야 하고, 고정된 부위에 혈관이나 신경의 합병증이 발생되지 말아야 하고, 종창으로 인한 골절부 전이가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부었다가 부기가 빠지면 골절부 전이가 잘 일어납니다. 골절부 환원 위치는 주기적으로 또 위험에 노출(많이 부었다 빠지던가 풀었다던가 등)되었을 경우 방사선촬영을 통하여 점검해야 하고, 경과에 따라 부목의 고정에서 더욱 든든한 고정 방법으로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고정된 골절부는 충분한 기간 유지 되어야 하고, 고정 기간동안 근육의 위축이나 관절의 구축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 위의 내용은 네이버 지식 창고에서 참조하였습니다.